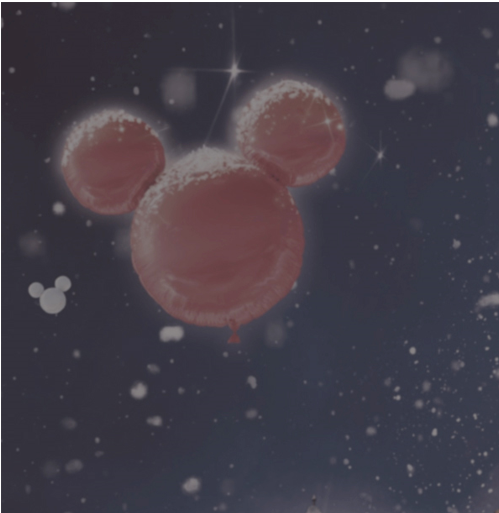반응형
| 가게 기둥에 입춘 | 격에 맞지 않음. |
| 가난한 집 신주 굶듯 | 창피하여 남에게 말도 못하고 잘 굶는 모양. |
| 가난한 집에 제사 돌아오듯 | 치르기 힘드는 일이 자주 닥쳐 옴을 이르는 말 |
| 가는 말에 채찍질 |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더 격려하는 말. "주마가편(走馬加鞭)"이란 말과 같다. |
| 가던 날이 장날 | 생각 않던 일로 공교로이 일이 잘 들어맞거나, 틀어짐을 말함. |
|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허물이 큰 자가 허물이 작은 자를 탓하거나, 결점 이 많은 자가 결점이 적은 자를 흉봄을 이름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기"와 "가마 밑이 노구솥 밑을 검다 한다"와 다 같은 뜻. |
|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말은 이 입에서 저 입으로 담을수록 거 칠어지는 것이니 말을 삼가라는 뜻. |
| 가뭄에 콩 나듯 | 썩 드문 일에 비김. 곧 매일 와도 좋은 사람이 수일 격하여 한 번씩 올 때 에 이렇게 말함. |
| 가재는 게 편이다 | 됨됨이나 형편이 비슷한 것끼리 어울리게 되어 서로 사정을 보아줌을 이르는 말. 비슷한 뜻의 한자성어 : 초록동색(草綠同色) 유유상종(類類相從) |
|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 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어버이는 걱정과 고생이 끊일 사이가 없다는 말. |
| 각자는 무상치 | 각자는 무상치 옛날 한 곳에 소싯적부터 글로 평생을 보낸 한 늙은 선비가 있었다. 그는 《논어(論語)》· 《맹자(孟子)》·《중용(中庸)》·《대학(大學)》·《서전(書傳)》·《시전(詩傳)》·《주역(周易)》, 《사서삼경(四書三經)》까지 많은 책을 읽었다. 그는 이로 하여 세상 만사를 무불통달한다고 생각하였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꼴머슴이 밖에서 여물을 썰다 들으니 노선비가 서재에서 글을 읽는데,《각자는 무상치》,《각자는 무상치》란 뿔을 가진 짐승은 윗니가 없다는 말이다라는 글귀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얼마동안 글을 읽던 노선비는 서재에서 나오며 무슨 말인지 남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입안에서 중얼거렸다. 평복에다 관만 쓰고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외출하려는 것이 아니고 집 울안에서 소풍하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노선비는 정원을 한 바퀴 돌더니 행랑채 있는 데로 나갔다. 행랑채에는 머슴들이 다 일 나가고 상머슴만이 집안 일을 돌보고 있었다.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노선비는 외양 옆의 거름 밭에 매논 큰 부럼소 옆으로 가더니 소가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다 상머슴이 불렀다. 《여봐라! 너도 이제는 나이 적지 않은데 아무리 무식하다 한들 저만한 일조차 모르느냐!》라고 첫마디부터 핀잔이었다. 상머슴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예-샌님, 무슨 분부이신 지요?》하고 물었다. 《야, 듣거라, 경서에 이르기를 경자는 역축이 좋아야 함이라 했나니라. 그런데 저런 노우로 어떻게 농사를 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저 소를 속히 개비하도록 하여라!》 《예이-,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상머슴은 주인인 노선비가 힘쓰고 부리기 좋은 황소의 무엇을 보고 개비하라는 지는 몰랐지만 그는 세상만사를 통달한다는 학자이므로 자기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주인이 친히 분부한 것이니 할 수 없어서 아까운 데로 그 소를 팔고 대신 부림새 좋을 것 같은 소를 사왔다. 그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노선비는 또 소풍하러 나왔다. 그는 전일 자기가 시킨 것을 제대로 했는가 생각났던지 행랑채로 와서 마당에 매논 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노여움이 나서 《야, 이 무식한 놈아, 어째 또 이런 노우를 사왔느냐?!》 라고 꾸짖었다. 상머슴은 역시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나 《노우》라는데 무슨 영문이 있는 것 같아서 《예이- 샌님. 이 소는 이제 나릅이올시다.》라고 하였다. 《나릅이라니?》 《예이, 네 살이라는 말입니다.》 《무식한 놈들, 사세면 사세고 네 살이면 네 살이지 나릅이 무엇이냐!》 노선비는 상머슴을 무식한 자라고 자못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어 《사세고 삼세고간에 윗니가 다 빠지고야 어떻게 초를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니 저리 우물거리는 것이 아니냐? 초를 많이 먹지 못하는 소가 어찌 일을 하겠느냐!》라고 노해하였다. 상머슴은 그제야 노선비가 나릅에 나는 소를 늙었다고 하는 뜻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말이라 대답도 해석도 못하고 속으로만 웃을 뿐이었다. 그대 꼴머슴이 꼴을 베여 지고 돌아왔다. 그는 노선비의 말을 듣고 있다가, 《샌님! 소인들이 무식하오나 어느 때 샌님께서 글 읽으시는 것을 들은 적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당돌한 놈 같으니 무슨 글귀를 엿들었느냐?》 《예이. 죄송하오이다. 그때 샌님이 서재에서 글을 읽으시는데 <각자는 무상치>라고 하시는 말을 들었습니다.》 《뭣이라냐? 그렇다. <각자는 무상치>라 하였느니라!》 노선비는 무안 당한 듯 종발걸음으로 서재를 들어가 고서를 뒤척이더니 쳐들고 나서 《각자는 무상치! 각자는 무상치!》라고 외우다가, 《옳다, 뿔 있는 자는 윗니가 없느니라!》라고 할 뿐 다시는 행랑채로 나오지 못하더라 한다. |
| 간에 가 붙고 염통에 가 붙는다. | 어느 날 배가 등에 붙은 암여우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한 마리의 노루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승냥이와 이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저놈들을 서로 싸우게 해야지.》 두 놈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우게 하고 어부지리를 얻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 답답해라. 여편네들처럼 대장부들이 마주서서 그게 뭐야요. 어서 이기는 편이 노루를 차지하세요.》 여우의 말을 듣고 승냥이와 이리는 물고 뜯었습니다. 힘이 비등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싸움은 승냥이가 우세를 차지하는 바람에 이리는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노루는 승냥이의 것이 되었습니다. 《승냥이 님이 이길 게 뻔했지요.》 여우가 승냥이 앞으로 다가서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편에 노루를...》하고 여우가 승냥이의 눈치를 힐끔 보며 아양을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망쳤던 이리가 자기네 무리들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잘못하다간 고기 한 점도 못 얻어먹겠구나. 어떻게 한다? 옳지...> 여우는 급히 승냥이에게 여쭈었습니다. 《승냥이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먹이를 저 벼랑꼭대기에 끌고 가면 이리 놈들이 그리고 올게 아닙니까? 그 때 벼랑 밑으로...해! 해...그럼 제가 저놈들을 벼랑 위로 안내합죠...해...해.》 여우놈의 잔꾀에 넘어간 승냥이와 이리들은 벼랑 우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노루 형제를 잃은 약한 짐승들이 모두 합쳐 쟁기를 들고 원수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승냥이와 이리는 겁에 질려 벼랑으로 굴러 떨어지고 교활한 여우놈만이 남았습니다. 기회를 엿보던 여우놈은 너스레를 피우며, 《착한 짐승들아,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았으니 돌아들 가거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우놈의 속셈을 알아차린 착한 짐승들은, 《간에 가 붙고 염통에 가 붙는 교활한 여우야. 네놈의 수에 속을 줄 아느냐. 벼랑 맛이나 봐라.》라고 하며 달려들어 여우를 요절내고 말았습니다. |
|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으면 탱자가 된다. | 귤과 탱자는 모양이 비슷하면서도 그 맛이 다르다. 귤은 달고 상쾌한 맛이 있지만 탱자는 시고 씁쓰레하다. 그 모양도 탱자는 작고 귤에 비하여 볼품이 적다. 본질적으로 선량한 사람도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사람으로 물들게 된다. 이와 비유한 말은 아니지만 이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오만한 나라의 임금의 콧대를 죽인 반면 자기 나라 위신을 세운 명신(名臣)의 이야기가 있다. 제(齊)나라 경공이란 임금 때에 안영이란 어질고 똑똑한 신하가 있었다. 그는 모든 면에 지식이 풍부한데다 언변도 좋고 슬기로와 임기응변에 능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제나라를 대표하여 곧잘 사신의 임무를 띠고 각국으로 다녔다. 안영이 초(楚)나라로 사신이 되어 가게 되었다. 초나라에서는 그가 사신으로 온다는 전갈을 받고 초나라 임금을 비롯하여 군신들이 모여 그 지혜 있고 언변 좋은 안영을 콧대가 납작하게 만들자고 상의하였다. 그리하여 초나라 군신들은 어떤 묘책을 세워놓고 그가 초나라에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영은 초나라 서울인 영도 성문 밖에 막 도착하였다. 그런데 웬 일인지 성문을 굳게 닫고 다만 성문 옆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 놓고 안영으로 하여금 그 구멍으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총명한 안영이 그 꾀임에 빠질 리 없다. 그는 이미 초나라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성문밖에 멈추고 서서 크게 꾸짓기를, "어서 성문을 열라. 이 구멍은 바로 개구멍이라 초나라 사람들이나 이곳으로 통행하지만 우리 제나라에서는 이러한 구멍으로 개나 드나들지 사람이 다니지 아니한다. 개나라 사람들은 모르거니와 사람의 나라는 이러한 문을 어찌 사람이 통행하는 문으로 쓰겠느냐?" 하고 호통쳤다. 초나라에서는 할 수 없이 성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영은 이윽고 궁중에 도착하여 초나라 임금과 만나게 되었다. 초왕은 안영의 체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몹시 작은 것을 보고 희롱하기를, "제나라에서는 사람이 그다지도 없어 이토록 작고 변변치 못한 인물로 사신으로 보냈단 말인고" 하니 안영은 태연히 그 말을 받는다. "우리 제나라는 어찌나 사람이 많은 지 길가에 수레바퀴가 걸려 길을 다닐 수 없으며, 또 길을 다니는 사람들도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루므로 어깨가 서로 걸려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거늘 어찌 사람이 없다 하십니까? 또 사신 보내는 일로 말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상례(常例)가, 크고 훌륭한 나라로 사신을 보낼 적에는 저와 같이 못생기고 키가 작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초왕은 안영의 말을 듣고 그만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였다. 안영이 초나라에 머물러 있는 사이 마침 도적을 잡았다고 초왕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그 도적은 대체 어떤 놈이냐?" "예- , 제나라에서 넘어와 사는 놈입니다." 초왕은 `옳다구나 안영을 골탕먹일 구실이 생겼구나.`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안영에게 묻기를 "제나라 사람들은 도적질을 잘 하는가?" 하니 안영이 서슴없이 대답하다. "대왕께서는 강남의 귤나무를 옮겨다가 강북 땅에 심으면 귤이 안 되고 탱자가 되는 이치를 모르십니까? 그 까닭은 강남과 강북의 수질과 토질이 같지 않은 까닭입니다. 제나라에서는 본시 도적이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아마 초나라 사람들이 도적질을 잘하는 관계로 우리 제나라 사람도 이곳에 와서는 그에 물들어서 도적질을 배웠나 봅니다." 초왕은 또 말문이 막혔다. 안영에게 욕을 뵈려다 도리어 그에게 당한 꼴이 되었다. |
| 강원도 안 가도 삼척(三陟) | 방이 몹시 춥다는 말. |
| 강원도 포수 | 옛날 강원도 어느 한 깊은 산골에 이름난 한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냥을 떠났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숲속에서 웬 짐승이 으르렁대는 소리를 들려왔다. 정신을 가다듬고 소리나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니 글쎄 황소 같은 호랑이 한 마리가 웬 사람을 물어다 놓고 고양이 쥐다루듯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장난질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목격한 사냥꾼은 사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범을 겨냥하여 화승네에 불을 달았다. 그랬더니 꽝 소리와 함께 《따웅》하고 하늘을 진감하는 대호의 비명소리가 산천을 뒤흔들더니 황소 같은 호랑이가 벌렁 나가 자빠졌다. 포수가 급히 사람한테로 달려가 보니 웬 아리따운 쳐녀가 겨우 들숨을 돌이키며 신음하고 있었다. 이런 정경을 목격한 포수는 더 생각할 새 없이 처녀를 들쳐업고 기겁으로 줄달음쳤다. 포수 내외가 지성껏 간호한 덕택에 처녀는 삼일만에 정신을 차리고 열흘만에 몸이 완쾌해 졌다. 원래 이 처녀는 임금이 애지중지 사랑해 오던 무남독녀였는데 그날 저녁밖에 산보하러 나갔다가 큰 호랑이한테 잡혀 이 산골에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봉사 길 안내는 목적지까지 하랬다고 본래 남의 곤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발벗고 나서는 포수인지라 인근마을에서 말 한 필을 얻어 공주를 그 말 위에 태우고 자기는 경마잡이가 되어 몇 날 며칠을 걸어 서울에 당도하였다. 한편, 무남독녀 외딸을 잃은 임금과 황후는 침식을 전폐하고 매일 울음으로 나날을 보내다보니 온 서울 장안은 마치 초상난 집처럼 스산하였다. 바로 이 때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오매불망 그리던 딸이 살아서 돌아왔는지라 궁궐 안은 잔칫집처럼 기쁨으로 들끓었다. 딸이 살아 돌아오게 된 자초지종을 듣고 난 임금은 대희하여 포수에게 천냥금과 벼슬을 하사하였다. 임금님의 어명을 듣고 난 포수는 궁궐에 들어가 엎드리며, 《임금님이 베푸신 은혜에 소인 감지덕지하오나 소인께 하사하시는 금전은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또 벼슬은 더구나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고 말하였다. 포수의 말에 임금 이하 궁궐 안의 모든 신하들은 너무 놀라 눈이 아홉이 될 지경이었다. 하긴 세상이 생긴 이래로 돈주어 싫다는 사람 못 보았고 벼슬자리 마다하는 머저리를 못 보았으니 말이다. 《무엇 때문에 벼슬과 재부를 다 마다하느뇨?》 임금도 포수의 내심을 알길 없어 한마디 물었다. 이에 포수는 머리를 조아려 다시 한번 절을 올리고나서, 《소인이 재부를 탐내었다면 죽어 가는 공주를 구할 대신 범을 잡아 팔아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벼슬이란 지간이 무식한 자에게는 당치도 않은 일인 줄로 아나이다.》하고 아뢰었다. 포수의 말을 다 듣고 난 임금은 머리를 끄덕이며, 《음, 과연 청렴한 군자로군!》 하고 치하하더니 또 한마디 묻는 것이었다. 《그럼 그대의 소원은 무엇이뇨?》 《네, 소원은 별다른 소원이 없사옵니다. 배운 것이 활쏘는 재주이니 짐승이나 잡아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잇고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을 낙으로 아뢰옵니다.》 일리 있는 포수의 말에 임금도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이때 곁에 있던 김정승이 포수의 재주와 군자다운 일 처사에 마음이 동해 그를 나라의 동량지재로 추천하려고 한마디하였다. 《남아대장부로 세사에 태어나 어찌 그런 맥빠진 소리만 하느뇨? 듣자니 그대 활재주가 비상하다는데 나라를 위해 왜적의 침입을 막아 볼 생각은 하지 않는단 말이냐?》 정승의 말에 포수는 얼굴을 지지 붉히면서 변명함아 한마디 올렸다. 《네, 소인이라고 어찌 그런 생각이 없으리까. 나라가 태평해야 백성이 안녕할 줄로 알지오만 소인은 무식하고 재주가 없음이 애통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런 마음만 있다면 짐이 이미 생각한 바가 있으니 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를 바라오.》 임금이 대희하여 포수에게 강원도 대장군으로 등용하였다. 포수 본래 타고난 재주 있는데다가 또 나라에 충성하여 외래의 적을 물리쳐 명성을 떨치니, 왜적들은 강원도 포수란 말만 들어도 겁이나 감히 얼씬도 못했다고 한다. |
반응형